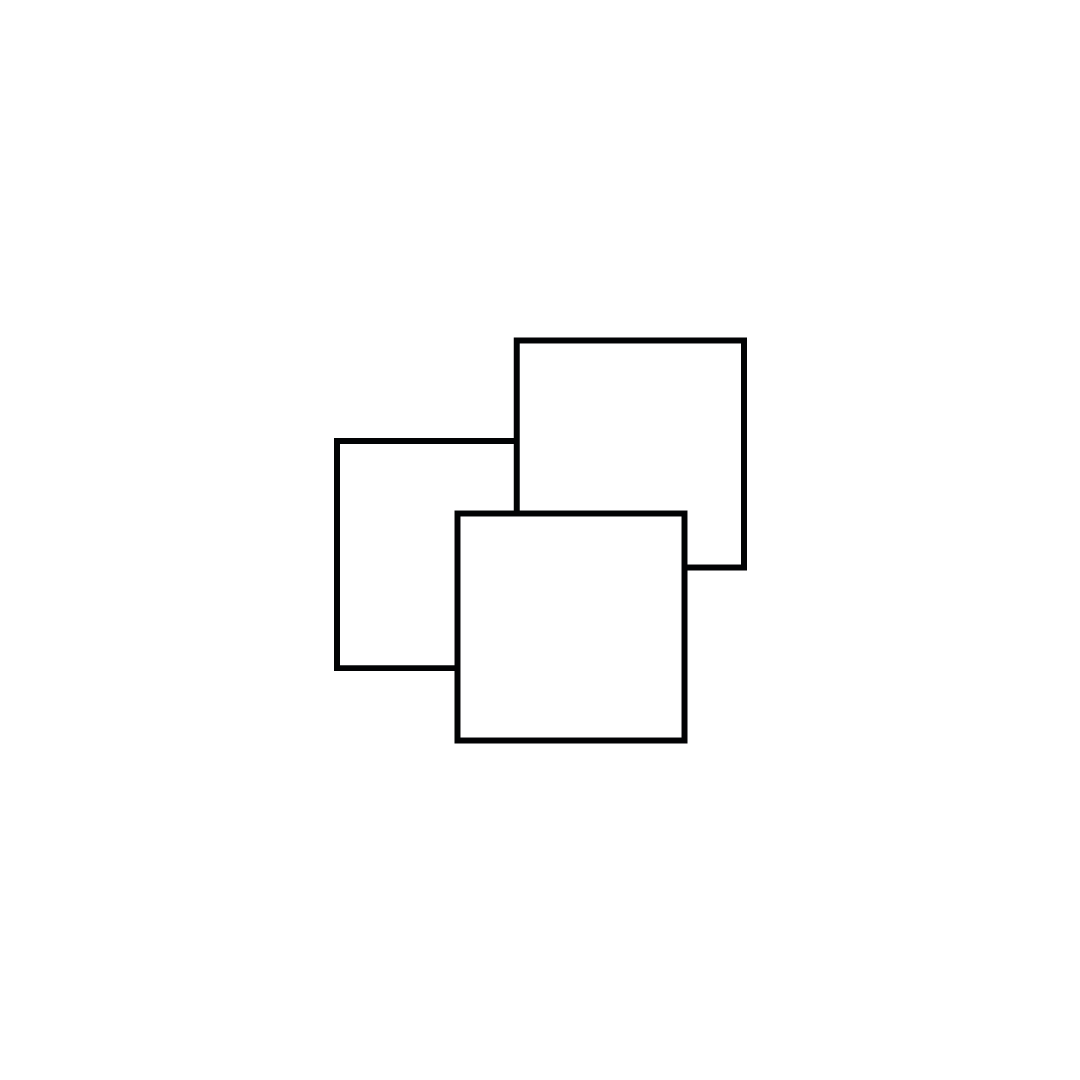≪떠오르는 숨≫, 프런티어터프
오늘 플랫폼피에서 열린 출판 제작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출간과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손익분기점을 계산조차 안 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것도 사업이니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얼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역시 이런 걸 계산하고 나면 갈 길이 멀다는 것만 실감이 나요. 앞으로도 손익만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고 싶진 않고, 그럼에도 계산을 잘 해서 아낄 수 있는 걸 아끼며 오랫동안 접촉면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떠오르는 숨> 제작을 위해 종이를 고를 때도 비용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이 넉넉해서는 아니었고, 첫 책이니 좋아하는 것들로 책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떠오르는 숨>의 본문 종이는 두성종이의 ’프런티어터프‘입니다. 작년부터 부쩍 종이에 관심이 생겨 종이에 관한 책들도 살펴보고, 강의도 몇 가지 들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프런티어터프였어요. 그때는 ’종이가 좋네‘ 하고 별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떠오르는 숨> 제작을 위해 두성종이 쇼룸에도 가고 이런저런 책을 들춰보다 역시 바다를 다룬 이 책에 어울리는 종이는 프런티어터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런티어터프에 감도는 회색빛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통통한 두께감을 만들어내는 게 좋았고요.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는 출판사의 첫 책이니, 또 회색빛의 종이는 학교 다닐 때 반성문용 종이나 시험지로 받아본 경험이 많아 저렴한 종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종이에 관심을 갖기 전의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회색빛 종이의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다소 높은 비용을 감수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지난주 여이연 발표 때 이 종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자료를 찾다 이재영 디자이너님의 글을 발견했어요. 출판문화 2023년 9월호에 실린 ’두성종이: 종이의 성격과 고유한 특징을 다룬다는 것‘이라는 글입니다. “프런티어터프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용지로, 단종된 바르니와 비슷한 인상을 준다. 종이의 평량은 65g과 80g으로 낮은 평량이지만, 두께감이 있고 가벼운 무게감을 만들어 낸다. 표면에 촉촉한 질감이 느껴지며, 자연스러운 회색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이를 사용해본 바 프런티어터프는 표면에 도공 처리를 하지 않은 중질지의 지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발색 표현력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다른 중질지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가벼운 특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책의 볼륨은 키우고 무게는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것이다.“라는 단락을 읽으며 이 종이가 왜 좋았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용 문제만 빼면 역시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출판사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매일 하지만 당연하게도 뾰족한 답은 없고요. 야무지게 손익을 계산하고 가능한 선에서 비용 절감도 잘하고 싶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부지런히 가져가 보자는, 또 그다지 답은 아닌 것 같은 결론만 우선 내려봅니다.